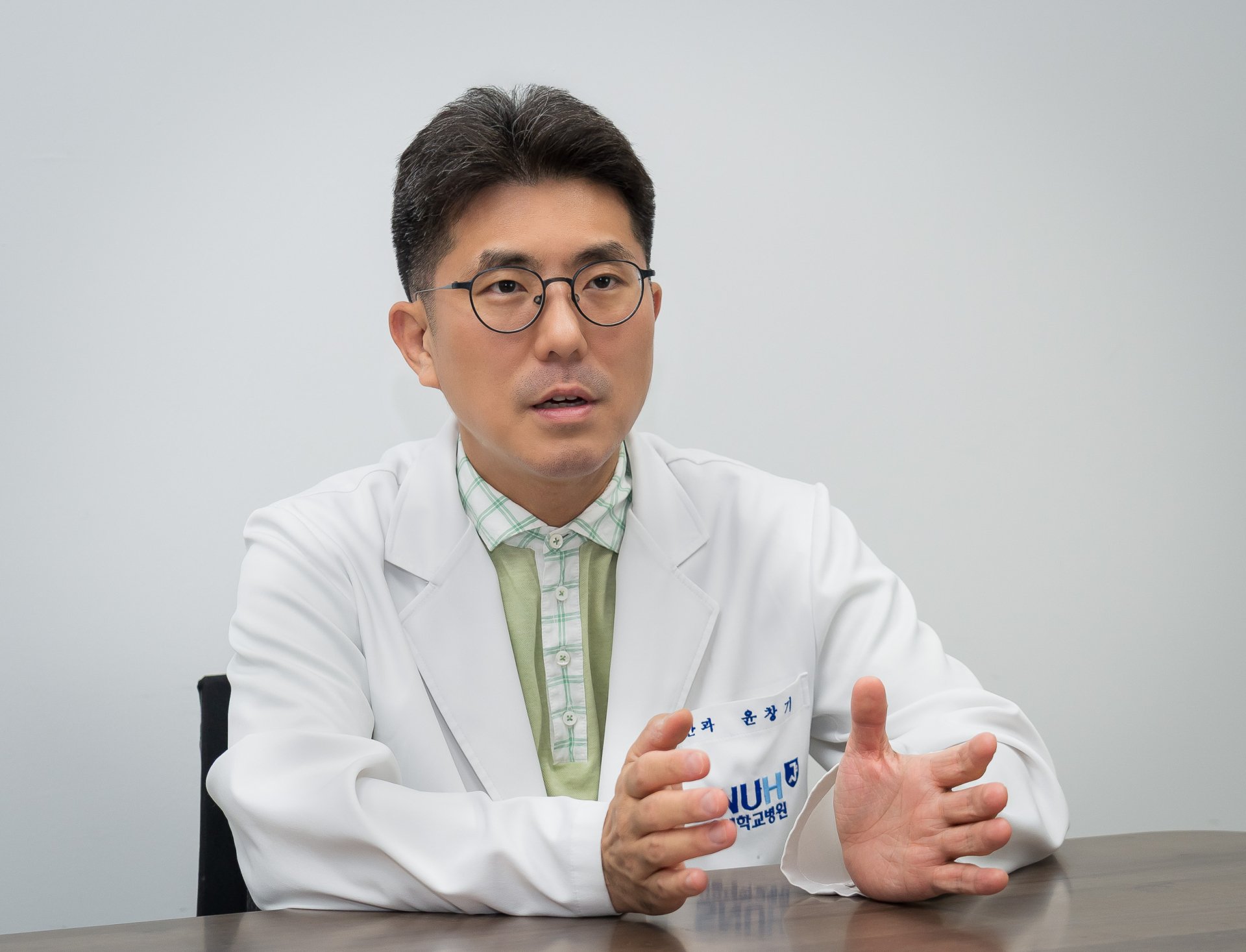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투자업계에서는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소급 적용 문제를 두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부칙에는 해당 개정안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도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개정안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는 자사주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둬 기업의 유연한 경영 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투자업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은 과세 없는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다. 의무 소각이 현실화하면 국내 증시에 존재했던 기보유 자사주 물량의 출회(오버행) 우려가 해소된다”며 “결과적으로 소각 의무화는 주주가치 제고와 투자심리 개선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소각 의무화 대상에 기보유 자사주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으로 인해 참정권·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는 법률이 과거에 있던 행위나 상황에 대해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면 제한 및 금지하는 원칙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보유 자사주에까지 소각 의무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따라서 개정안의 부칙 내용은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입법 시에도 강한 정치적·법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페널티 형식으로 소급 적용할 경우 행동주의펀드의 기업 경영권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내 기업은 계열사 주식들을 통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극단적인 경우 해외 자본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 도입과 자사주 소각 우수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등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