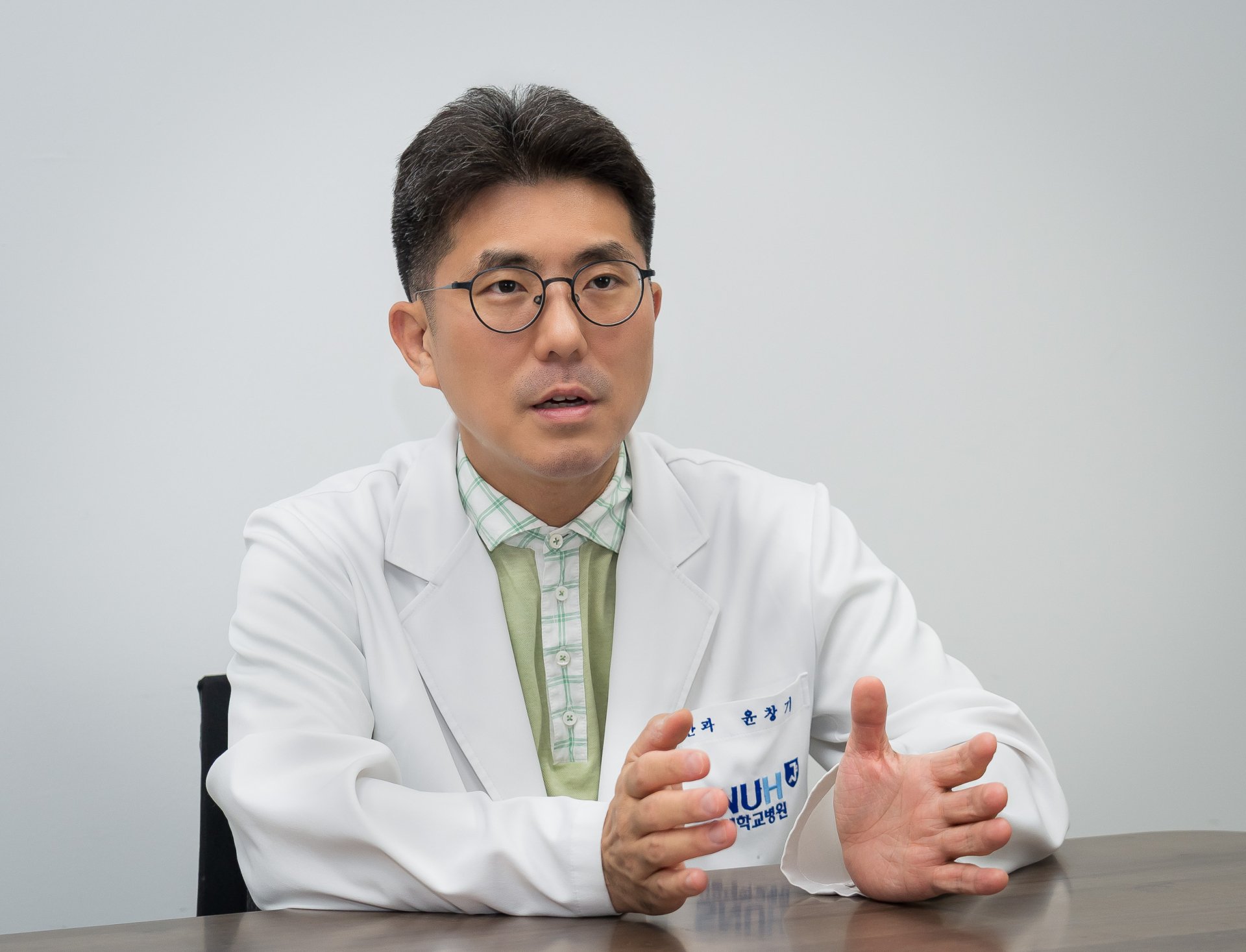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 2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4만여 대의 시내·시외·마을·고속버스 운행이 동시에 멈추게 된다. 이는 2019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9개 지역 버스노조 파업 예고 이후 최대 규모다. 버스업계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2년 연속 파업 사태이기도 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서울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서울시의 교통 정책과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을 해 왔다. 이 제도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 올해 서울시의 버스 재정적자만 9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시내버스 임단협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시 약 25%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며 재정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요구안을 수용하면 버스 운전직의 평균임금은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상승되며, 예산 대비 약 28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의 임금 인상 제안이 과도한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버스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목표지만 현실에선 여러 왜곡을 낳았다.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졌고, 노동자 처우는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시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의 질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는 이번 파업 사태를 두고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가 원만히 협의하길 바란다”면서 임단협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예의주시하며 파업 수송 대책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며 재정 건전성과 서비스 혁신,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개편은 없었다. 선언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부재했다. 매년 수천억원의 시민 세금이 준공영제 운영에 투입된다. 버스 노선 배분, 재정 지원, 심지어 수입금 정산 방식까지 서울시가 결정한다. 그런데 임금 협상이나 근로조건 논의가 나오면 정작 뒷짐지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단지 이론적 비판이 아니다. 2023년 대전고등법원도 서울시와 구조가 유사한 대전시 사례에서 지자체를 ‘공동 운영주체’로 인정한 바 있다.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겉핥기식 지원과 미봉책만 반복된다면 버스 파업 같은 갈등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준공영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버스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 서비스를 강조해 왔다. 공공은 언제나 책임이 뒤따른다.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할 때 꺼내는 변명이 되어선 안 된다. 준공영제를 유지하겠다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