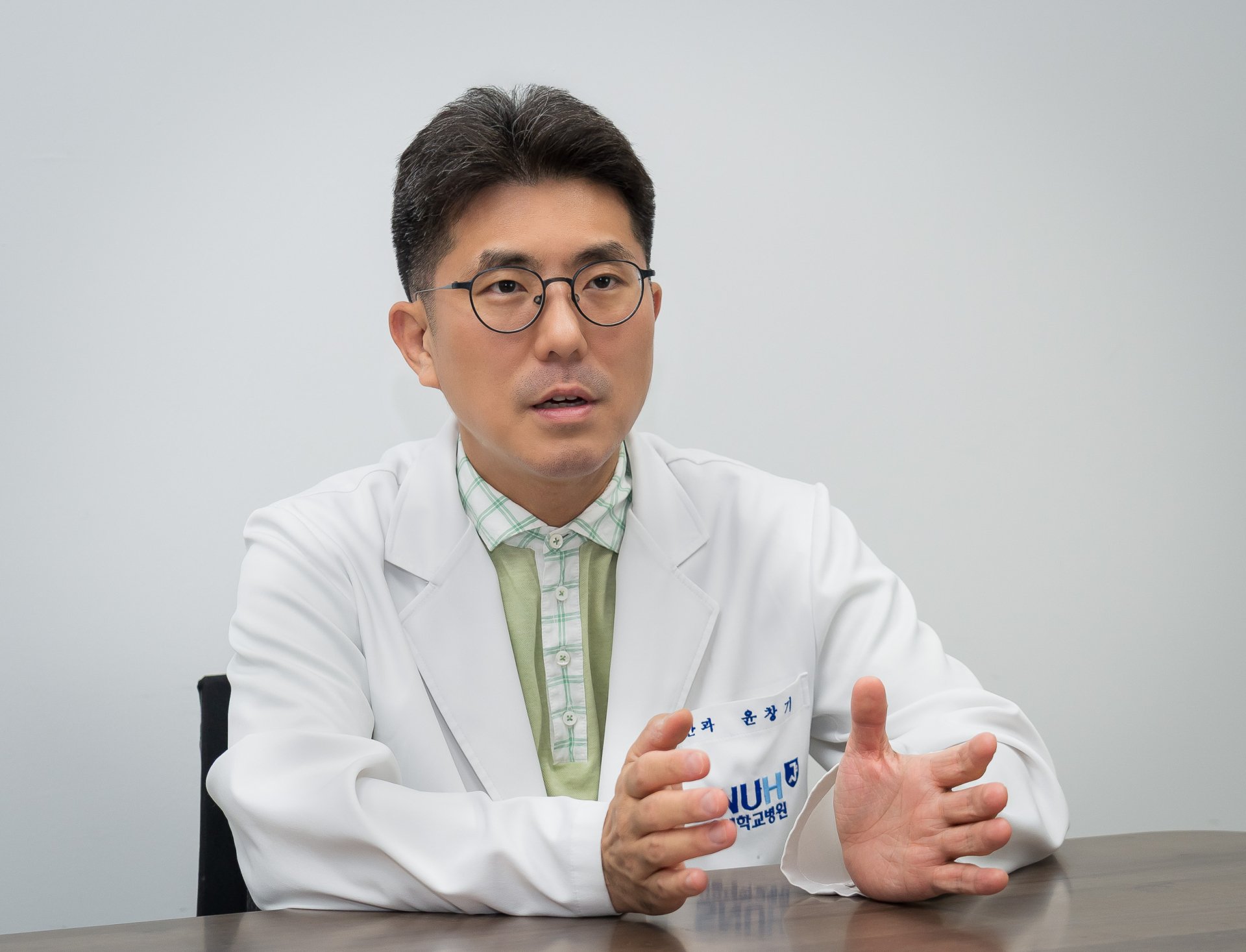| 중국의 기술 굴기와 미·중 패권 경쟁이 전 세계 산업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한국 산업도 거센 파고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필자는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그중 절반을 중국에서 보냈다. 중국의 부상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 속에서 한국 기업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었는지 목도했다. 현장에서 실무를 책임졌던 시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빚어낸 변화를 연재한다. ‘이병철의 세계를 보는 눈’은 글로벌 산업 판도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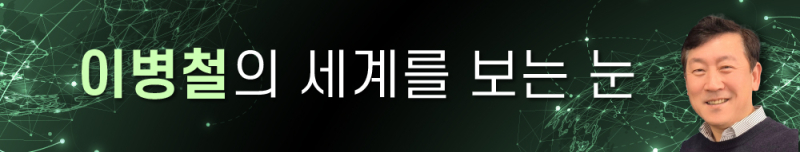
한국 경제는 미·중 패권 경쟁과 중국의 기술 굴기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며, 생존 전략의 전면적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결코 하루아침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이는 건국 이후 70여 년간 축적한 국가전략의 산물이다. 뿌리는 모택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신중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기술 발전에 속도를 냈다. 초기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 핵무기·인공위성 등 전략 무기 개발에 착수했지만, 1960년대 초 중·소 갈등이 격화되자 소련은 기술 지원과 전문가 파견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은 곧바로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기치로 전략 기술 개발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1964년 원자탄, 1967년 수소탄, 1970년 인공위성을 잇달아 성공시켰다. 중국이 흔히 말하는 ‘양탄일성(两弹一星)’을 완성했다.
1989년 톈안먼 사태는 또 다른 분기점이었다. 시위 진압 이후 서방의 제재로 첨단 기술 수출이 제한되자, 중국은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면 언제든 봉쇄당할 수 있다”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1999년 코소보 사태 때는 나토의 공습 과정에서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이 폭격 받아 외교관이 숨졌다. 미국은 지도 오인에 따른 실수라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 내부에선 서방이 보여준 정밀 타격 능력과 군사·위성·정보기술 수준에 큰 충격을 받았다.
2001년 하이난(海南) 상공에서는 미 해군 EP-3 정찰기가 중국 전투기와 충돌해 하이난도에 불시착했다. 중국은 해당 기체를 해체·분석한 뒤 미국에 반환했고, 이 과정에서 양국의 전자·항공·정찰 기술 격차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이 우주·전자전 역량을 반드시 자립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인식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결정적 전환점은 2018년 ZTE 사태였다. 대이란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이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공급을 전면 중단하자, ZTE의 생산라인은 불과 며칠 만에 멈춰 섰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주요 사업이 사실상 마비됐다. 한 기업의 존망이 외부 핵심기술 의존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은 중국 사회 전체에 전율을 안겼다.
2022년에는 미국 주도의 첨단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금지가 중국 전체를 겨냥해 단행됐다. 14nm 이하 공정 장비와 기술 인력의 대중 이전이 폭넓게 차단되면서, 시진핑 정부는 ‘과학기술 자립자강(科技自立自强)’을 한층 더 가속하게 됐다.
중국의 기술 굴기 키워드는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모택동 시기 ‘자력갱생(自力更生)’, 등소평 시기 과학기술은 제1 생산력(科学技术是第一生产力), 후진타오 시기 ‘자주창신(自主创新)’, 시진핑 시기 ‘과학기술 자립자강(科技自立自强)’. 표현은 달라졌지만, ‘외부 의존 최소화, 핵심기술 자립’이라는 국정 기조는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은 성격이 다르다. 그 배경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전면화된 냉혹한 현실이 있다. 과거의 ‘자력갱생’이나 ‘자주창신’이 장기적 국가 비전이었다면, ‘자립자강’은 생존을 걸고 미국과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국가적 총력전의 선언이다.
이런 전략은 투자와 인재로 뒷받침됐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PPP) 기준 2023년 미국의 국내 총연구 개발 지출(GERD)은 약 8,234억 달러, 중국은 약 7,899억 달러로 미국의 96% 수준까지 추격했다. 중국의 R&D 투자는 2013년 미국의 약 72% 수준에서 10년 만에 96%까지 올라왔다. 특히 정부 부문 R&D 지출은 미국의 약 1.6배에 달해, 국가 주도의 기술 개발 의지를 보여준다. R&D 지출 증가율에서도 중국은 8.7%로 OECD 평균(2.4%)과 미국(1.7%)을 크게 앞질렀다. 한편, 한국은 GDP 대비 R&D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5%)이지만, 연간 R&D 총액은 약 1,390억 달러로 중국의 17%에 불과하다.
R&D 인력 측면에서 중국은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R&D 연구자 전일제 환산(FTE) 기준 중국은 약 635만3,570명, 미국은 약 264만6,498명으로 중국이 미국의 약 2.4배에 달한다. 이는 2015년 대비 중국이 약 4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미국의 증가율(약 14%)보다 3배 이상 빠르다. 한국은 2022년 총연구원 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TEP 통계) 약 60만 명으로, 이는 중국의 약 7.7%, 미국의 약 18.5% 수준에 불과하다.
인재 풀도 막강하다. 2024년 중국의 대학 졸업생은 약 1,179만명으로, 이 중 40%인 470만 명이 이공계 출신이다. 2025년에는 1,22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43만 명 증가한 수치다. 이 증가분만 해도 한국의 연간 대학 졸업자 수(약 50만 명)에 거의 맞먹는다. 중국의 졸업생 수는 매년 약 3%씩 늘어 2038년에는 1,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로 미국 내 중국계 과학자들의 귀국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중국 굴기를 가속하는 역설적 장면이 펼쳐지는 셈이다.
중국은 기술 인재의 절대 규모에서 압도적일 뿐 아니라, 최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로 쏠리고 있다. 최근 한 한국 방송에서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화제를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에서는 이공계가 기회와 보상 면에서 그만큼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중국 엔지니어들의 근무 환경은 세계적으로도 강도가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996’(오전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 문화다.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성과 중심·속도 중시의 업계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용인된다.
심천이나 상하이 같은 혁신 거점 도시에서는 밤 12시 무렵 택시를 잡기 힘들 만큼 연구개발이 이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가로 높은 보상과 빠른 승진이 보장되기에,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 강도 높은 근무를 기꺼이 감수한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경쟁국인 한국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과거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시절, 한국 기업은 중국에 공장을 세워 수출하며 상호 이익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기업의 약진으로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은 물론, 주력 수출 시장에서도 정면 승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대중 견제가 일시적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결국 대결은 불가피하다. 태양광·통신 장비·LED 산업이 중국의 글로벌 진출 이후 초토화된 전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대형 LCD 패널은 삼성과 LG가 이미 철수해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한국의 LCD TV 생산은 중국 패널 공급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OLED 패널도 BOE, CSOT 등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며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반도체 역시 변화가 빠르다. 중국의 낸드플래시 업체 YMTC와 D램 업체 CXMT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58%를 확보했고, 한·중 간 기술 격차는 34년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다. 중국 기업 점유율은 2019년 51%에서 2024년 67.1%로 급등했지만, 한국은 35%에서 18.4%로 하락했다. CATL과 BYD가 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
기존 주력 산업이 줄줄이 추격 받고 있으며, AI·바이오·자율주행차·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앞서간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한국은 중국의 거센 도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무엇보다도 기술 우위의 확보다. 경제와 안보가 일체가 되는 경제 안보 시대, 기술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 국가 R&D 투자액을 과감히 늘리고, 최고 인재들이 다시 이공계로 몰릴 수 있는 매력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 개발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도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제한 등 경직된 제도는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 기술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의 산물이다. 경쟁국은 많은 인력이 우수한 머리로 장시간 투입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이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개발 시간까지 경직되게 제한한다면 이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둘째,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중국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중국을 멀리할수록 기회는 사라지고 위험 노출만 커진다. 중국에 관한 공부를 강화하고, 중국 관련 전문 인력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특화 분야를 발굴해 중국 시장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 기존의 직접투자식 협력 모델은 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3국을 통한 우회 협력, 기술·표준 공동 개발, 고부가가치 서비스 연계형 사업 모델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역동적 기업 문화의 복원이다.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과거의 기업문화로는 지금 세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어렵다. 세대가 바뀌고 산업의 패러다임도 변하는 시대에 기존의 인사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인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동기부여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제도적·문화적 걸림돌은 국가 차원에서도 경청하고 해소해야 한다. 기업 내부 문화가 역동성을 잃으면 어떤 전략도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미·중 경쟁, 중국의 굴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국내 정치 지형 변화까지. 기업이 맞닥뜨린 도전은 셀 수 없이 많다. 외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결국 우리가 스스로 변해야 한다. 국가대항전의 시대에 대응 전략은 산업계 혼자 만들 수 없다. 국가, 산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국내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위기의 원인 분석과 해법은 진영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이야말로 무엇을 할 것인지 국가적 각오를 다져야 한다.